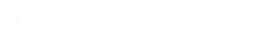배설선조 명예회복
소설 영화 <명량>관련 비상대책 위원회(비대위) 활동보고
배 한익 (전 비대위 부위원장 겸 전 종회장)
* 아래 내용은 2014년 8월 비대위가 출범하고, 1년간의 활동을 <2015년 8월 12일>의 시점으로 작성한 원본 보고서입니다.
약간의 수정으로 역사적 생동감을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2014년 8월 9일, 영화<명량>과 동명 소설의 역사왜곡을 대처하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성산성주배씨 서암공파 종회의 비상 특별기구로 구성되어, 집행위원회(위원장 배한동, 경북대학교 명예교수)와 운영위원회(위원장 배한경, 차종손)를 구성하였고, 배설장군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자 다방면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비대위의 활동 목표는 배설 장군에 대한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선조의 명예를 회복하며, 뛰어난 선조의 업적을 찾아내고, 널리 알려서 후손들이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비대위 활동은 관련논문, 성명서, 활동일지, 국민권익위원회 소원서, 국방부 민원제출 등을 수록한 자료집을 10회에 걸쳐서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집안 종친회, 대종회,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여 강연과 교육을 하였습니다. 비대위의 활동은 KBS, MBC, YTN, 채널 A, 경인 방송, 포항 MBC 등 각종 방송프로에 실렸으며, 조선 PUB, 주간 동아, 중앙일보, 오마이뉴스, 경북일보, 매일신문, 엠플러스한국 등의 언론에서 객관적으로 기사화되어 실렸고, 여러 비평도서에서 우호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현재 배설장군의 명예회복을 위한 소설이 2편 배영규저 <명량, 왜곡과 진실>과 정만진저 <기적의 배 12척>이 발간되고, <성산성주배씨 진사공파 홈페이지 구축>, <한글 전자족보>, <성산성주배씨진사공파보>의 출판이 진행 중입니다. 고향 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영화 <명량> 감독 김한민, 각본 전철홍, 작가 김호경과 배급사 CJ E&M을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고 현재 강남경찰서를 거쳐 검찰에서 조사 중입니다.
이번 일은 먼저 경주배씨 대종회가 전국 회원들에게 널리 알리고 촉구하여 배씨 전체가 대동단결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여러 종친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설 장군의 생애
제1부 출생과 생애
1. 출생
字는 仲閑이며 號는 西岡이다. 明宗 辛亥(1551년)에 父親 書巖 德文과 母親 善山 白氏 사이에서 長男으로 星州牧 內西面 今巴谷坊 後浦里에서 태어났다. (성산배씨 진사공파보)
2. 유년시절
어려서 칠봉(七峰) 김희삼(金希參)에게 수학하였는데 용력이 출중하고 문장에 능하였고, 국량이 과인(過人)하여 칭송을 받았다. 10 여세에 당시 울산 군수였던 부친을 따라 갔다가 그곳에서 만난 병마 절도사 장필무가 장수의 재목을 알아보고 권하여 무인의 길을 택했다. (경산지. 서강장군 신도비)
3. 등과. 변방 근무. 전생서(典牲暑) 주부(主簿)
선조 16년(1583) 31세에 무과(武科) 별시에 급제하고 변방(邊方)에서 세운 공으로 전생서(典牲暑) 주부(主簿)로 승진했다.
(경산지. 정만록)
제2부 임진.정유년 조일전쟁기간 활동과 공적
1. 경상도 방어사 조경의 휘하 군관으로 활동
방어사(防禦使) 조경(趙儆)을 따라 4월 15일 남정(南征)에 나서 선산(善山)쪽의 적(賊)들을 살피는 정찰활동을 하고, 추풍과 김산(김천)역에서 전투하여 공을 세웠으나 조경이 부상을 입자 병사들이 모두 흩어졌다. (난중잡록, 정만록, 용사일기, 용사실기, 서강장군 신도비)
2. 부친에게 의병 창의를 요청 (1592년 4월)
4월 성주(星州)에 도착하자 부친(父親)에게 의병(義兵)을 창의(倡義)해서 군사(軍士)를 모아 적(賊)을 대항(對抗)해 줄 것을 요청(要請)하여 형제(兄弟)들과 매부, 사위가 의병으로 나서게 했다.(영남신민에 내리는 교서, 정만록, 난중잡록, 경산지. 등암선생문집.)
3. 경상감사 김수의 군관으로 활동 (1592년 5 -6월)
5월 3일 조경(趙儆)의 부상(負傷)으로 병사(兵士)들이 흩어져 도망(逃亡)을 가자 68세의 노구인 부친(父親)과 형제(兄弟)들 과 향병(鄕兵)을 모아서 고향마을 (자리섬)에서 훈련을 시켰다.
경상감사(慶尙監使) 김수의 군관으로 경성(京城) 수복(收復)을 위해 수원(水原)을 거쳐 경성(京城)에 적(賊)들을 살펴보는 일을 했다.(난중잡록, 정만록, 경산지, 용사일기. 등암선생문집)
4. 성주 가장으로 활동 (1592년 6월-11월)
성주(星州) 가장(假裝)으로 활동할 때는 김면(金沔) 정인홍(鄭仁弘) 이 의병(義兵)을 모집(募集)해 간 다음이라 병사(兵士)들의 수효가 적어서 주로 부상현(扶桑縣) 등지에 복병(伏兵)을 하여 공(功)을 많이 세웠다. (정만록, 양호당일기, 경산지,난중잡록, 등암선생문집)
5. 합천 군수가 되다 (1592년 11월 8일)
성주(星州) 가장(假裝)으로 활동하면서 세운 공(功)으로 합천(陜川)군수가 되었다. (고대일록, 경산지, 성산지, 등암선생문집)
6. 진주 목사가 되다 (1592년 12월 28일)
진주성(晉州城) 1차 전투(戰鬪)(10월 6일- 10일)에서 김시민(金時敏)이 크게 부상(負傷)을 당하자 김성일(金誠一)이 김해(金海) 목사(牧使) 서예원을 진주 가목사(假牧使)에 임명하였으나, 조정에서 서예원을 김해(金海) 목사(牧使)로 돌려보내고 합천(陜川) 군수(郡守) 로 임명한지 한 달 남짓된 배설(裵楔)을 진주목사(晉州牧使)에 임명하였다. (고대일록)
7. 부산 첨사 겸 동래 현령이 되다 (1593년 4월 15일)
왜군들이 수세에 몰려서 철수하면서 부산(釜山)과 동래(東萊)를 통해서 노략물자를 일본으로 보내고 일본군이 두 왕자를 잡아서 본국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시기에 조정은 진주 목사에 임명했던 배설(裵楔)을 다시 부산 첨사 겸 동래 현령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경산지, 성산지, 등암 선생문집)
8. 진주 목사 겸 조방장이 되다 (1593년 여름)
1593년 왜군들의 제2차 진주성 공격(6월 21일- 28일)으로 진주성이 함락되고 성안의 장수들과 백성들 6만명 도륙(屠戮)을 당하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자 조정은 다시 배설(裵楔)을 진주목사(晉州牧使) 겸 조방장에 임명하였다. (선조실록, 경산지, 이순신 난중일기, 등암선생 문집)
9. 경상우도수군절도사가 되다 (1594년 12월 3일)
조정에서 1594년 12월 경상우수사(慶尙右水使)로 임명하였으나 진주 남녀노소(男女老少) 백성들이 성문(城門)을 막아 두 달이 넘도록 임지로 떠나지 못하자 조정에서는 이 일로 세 차례 회의가 있었다. (선조실록, 이순신 난중일기, 난중잡록, 등암선생 문집)
10. 밀양부사가 되다 (1595년 6월 15일)
경상우수사(慶尙右水使)로 재직하면서 병영(兵營) 내 폐단(弊端)과 부조리(不條理)의 개선(改善)을 요구하는 상소(上疏)를 올린 일로 문관 대신들에 의해 ‘무장이 오만하다’며 국문(鞠問)을 당하고 밀양부사(密陽府使)로 좌천되었다. 이 때 수군통제사(水軍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고 난중일기에 적었다. (선조실록, 이순신 난중일기)
11. 선산부사 겸 금오산성 별장이 되다 (1595년 8월 5일)
조정은 명나라 장수의 지적에 따라 금오산성(金烏山城)을 수축(修築)하려고 하는데 당시 선산부사(善山府使) 김윤생이 ‘오졸한 서생이라 일을 잘 경영할 수 없다’고 하여 ‘어쩔 수 없다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배설(裵楔)을 선산부사(善山府使)에 임명하고 천생산성과 금오산성(金烏山城)을 수축(修築)하니 다시 선산부사 겸 금오산성 별장(別將)으로 임명하였다.
금오산 도선굴 가는 길옆 암벽에는 선산부사 배설이 금오산성을 수축한 내용이 “금동병신(金洞丙申(1595년) 선산부사(善山府使) 배설(裵楔) 축금오성북공사(竺金烏城北共士 )라고 음각되어 있으며 금오산성 기념각에도 ‘선산부사 배설 천금오산성구정칠택(善山府使裵楔 穿金烏山城九井七澤)’이라는 글씨가 현판에 보존되어 있다. (선조실록)
12. 재차 경상우도수군 절도사가 되다 (1597년 2월 7일)
선조실록(宣祖實錄)에서는 이순신(李舜臣)이 네 가지 죄목(罪目, 남의 공을 가로챈 죄, 임금을 속인죄, 임금을 능멸한죄, 항명한 죄)으로 잡혀가고 이순신(李舜臣)과 가까웠던 배흥립(裵興立)이 파직되니 조정은 다시 배설(裵楔)을 경상우수사(慶尙右水使)에 임명하였다.
이 때 선조는 거북선과 판옥선을 많이 만들 것을 지시하였는데 배설(裵楔)은 1차 경상우수사(慶尙右水使)로 임명되었을 때에도 조정에서 둔전(屯田)의 관리에 관한 지시에 따라 둔전을 만들고 관리하는 내용을 이순신(李舜臣)은 난중일기에서 여러차례 언급하였다. 배설(裵楔)이 거북선과 판옥선을 만드는 일에 충실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칠천량 해전에서 온전히 살아남은 판옥선이 모두 경상우수영 부대 전함 뿐 이었다는 점이다. (선조실록. 이순신 난중일기. 경산지. 성주대관. 성산지. 고대일록,등암선생문집)
13.수군 선봉부대로 활동하다 (1597년 6월 26일)
수군(水軍)의 편제가 1597년 6월 26일에 변경되어 각 부대가 독립하여 전투를 벌였는데 경상우수영(慶尙右水營) 지역이라 지형에 밝고 지략(智略)과 용맹(勇猛)을 갖춘 경상우수영 부대가 선봉부대로 활동하게 되었다. (선조실록)
웅천해전과 칠천량 해전에서 경상우수영 부대는 항상 선봉부대로 싸웠다. 그 이유는 경상우수영 격군들과 수군들이 경상도 바다 지형을 잘 알고 있었고, 배설(裵楔) 부대의 판옥선이 경상도에서 자라는 소나무로 만들어 남쪽 전라도 판옥선보다 튼튼하였기 때문이다. (선조실록, 해소실기, 이순신의 난중일기)
배설(裵楔)은 성주(星州)가장(假裝)으로 활동할 때도 늘 김면(金沔)과 정인홍(鄭仁弘)의 의병(義兵)부대보다 선봉부대로 싸웠던 기록이 있다. (양호당일기)
14. 마지막 남은 조선 수군 부대장이 되다.
칠천량 해전에 통제사(統制使) 원균(元均), 전라우수사(全羅右水使) 이억기(李億祺), 충청수사(忠淸水使) 최호(崔浩)가 전사하고 오직 경상우수사(慶尙右水使) 배설(裵楔) 만이 바다의 적(賊)을 막고 있었다. 당시 새로 임명된 전라우수사(全羅右水使) 김억추(金億秋)는 병사(兵士)와 판옥선(板屋船)도 한 척 없는 상태였고, 배설(裵楔)을 도와서 회령포에서 명량해전을 대비하고 있었다.(선조실록, 김억추의 현무공실기, 이순신의 난중일기)
이순신(李舜臣)도 당시에 ‘배설(裵楔)이 탈 배를 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고 있었다. (이순신의 난중일기)
15. 도원수(권율)과 체찰사(이원익)의 패전 책임 전가 (1597년 8월 5일)
칠천량에서 대패하자 선조(宣祖)는 당시 전쟁을 참관했던 선전관(宣傳官) 김식의 보고를 받고 패전의 책임이 도원수(都元帥)가 무리하게 전쟁을 독려한 때문이라고 했다. (선조실록)
당시 전쟁에 대한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른 장계가 있었으나, 체찰사(體察使) 이원익(李元翼)은 자신과 권율(權慄)의 구명을 위해 다시 장계를 올려서 패전의 책임은 배설(裵楔)과 배흥립(裵興立) 등 두 사람에게 있었다는 보고를 했다. (선조실록, 이순신의 난중일기)
당시 우월적 문관(文官) 중심의 조정은 왕족인 이원익(李元翼)과 병조판서(兵曹判書) 이항복(李恒福)의 장인(丈人)이던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에 대한 구명을 위해서는 설사 그들이 패전의 책임자로 지목되었으나 재조사를 벌여서라도 무장(武將)들에게 책임(責任)을 넘기고, 문관(文官)들이 면책(免責)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다. (선조실록)
16. 선조의 수군폐지 명령으로 파직되다 (1597년 8월 15일)
선조(宣祖)의 수군폐지(水軍廢止) 교서(敎書)는 8월 15일 보성 열선루에 있던 이순신(李舜臣)에게 전달되었으나, 이순신(李舜臣)은 이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배설(裵楔)은 이 명령을 받자 바로 교서(敎書)에 숙배(肅拜)하고 수군 폐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이순신 난중일기)
이순신(李舜臣)과 배설(裵楔)은 서로 다른 견해로 갈등하다가 배설(裵楔)이 이순신(李舜臣)에게 장작귀선과 병사들을 인계하고 떠나기로 하자 군심(軍心)이 하나로 안정되었다.(이순신의 난중일기)
이순신(李舜臣)에게 전함과 병사들을 인계하고 배설(裵楔)이 완전히 떠나자 이순신(李舜臣)은 배설(裵楔)을 도망(逃亡)갔다고 규정하였다. (이순신의 난중일기)
17. 백의 종군 하면서 수군을 지원하다 (이순신의 난중일기)
배설(裵楔)은 파직으로 직위 없는 장수(將帥)가 되어 자신의 경상우수영 지역이던 하동지방 고소산성에 머물며 적세를 살펴서 수군에 전달하며 전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수군을 도왔다는 기록과 정유년 10월에 성주에서 바다로 퇴각하던 왜군을 크게 무찌르게 되는데 여기서 참전하고 이 정보를 이순신에게 전달했다는 두 설이 있는데, 정유년 10월 14일 이순신은 ‘경상도에서 배의 종이 와서 적세를 알려 왔다’고 적고 있다.
18. 도망자 신분이되다 (1597년 10월 13일)
이순신(李舜臣)은 명량해전이 승첩(勝捷)함으로서 선조의 수군(水軍) 폐지(廢止)에 대한 자신의 항명(抗命)이 문제가 되지 않고 조정에서 칭송을 받게 되자, 배설(裵楔)을 도망자(逃亡者)로 보고 했다. 그리고 배설(裵楔)과 함께 했던 장수(將帥) 가리포 첨사(僉使) 이응표와 전라우수사(全羅右水使) 김억추를 탄핵하는 장계도 함께 올려서, 자신과 가까운 이순신(李純信)을 경상우수사(慶尙右水使)에 임명하게 하였다. (선조실록, 이순신의 난중일기.)
19. 모반죄로 체포령이 내리다 (1598년 12월 26일)
전쟁이 끝나가는 때 이순신(李舜臣)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하던 날(1597년 11월 19일), 서인(북인)정권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민심수습을 위한 전쟁 책임을 동인 진영에 돌려 동인의 영수격인 유성룡(柳成龍)을 탄핵한 다음, 전쟁이 끝나자 7년 전쟁에서 살아남은 최고위 장수인 배설(裵楔)에 대해, 전쟁중 유성룡(柳成龍)은 간성(干城)이라 하며 추천한 인물로 본,
20. 모함에 의해 순절하다 (1599년 3월 6일)
당상관(堂上官) 벼슬을 지낸 사람???은 역모(逆謀)가 아니고는 처형(處刑)할 수 없기에 모반(謀叛)을 꾸민다는 누명(陋名)을 씌워 체포 하였으나 원래 부터 혐의(嫌疑)가 없는 일이라, 국문(鞠問)도 없이, 서둘러 죽인 후에는 한산(칠천량)해전 패배의 책임을 물어서 죽였다고 기록(記錄)하면서 임진란(壬辰亂) 초기(初期) 선조(宣祖)가 행재소(行在所)에서 영남의 신민에게 내리는 교서에서 공적을 치하하고 제독(提督) 사제감정(司帝監正)에 제수 되었던 배설(裵楔)의 부친(父親) 배덕문(裵德文)의 이름을 배덕룡(裵德龍)으로 장남(長男) 배상룡(裵尙龍)을 배상충(裵尙忠)으로 조작하여 선조(宣祖)에게 보고 하였다. (선조실록)
21. 영남 유림들의 항의 상소
배설(裵楔)이 모함(謀陷)에 의한 순절(殉節) 직후 석 달간 병조판서(兵曹判書) 홍여순(洪汝諄)을 탄핵(彈劾)하는 장계가 선조실록(宣祖實錄)에서 확인한 것만도 무려 99회였다. (선조실록).
22. 경상감사 한준겸이 배설의 장례를 지내다
배설(裵楔)이 억울하게 순절(殉節)하자 장남(長男) 배상룡(裵尙龍)이 운구(運柩)하여 선산지방 낙동강 변에 가장(假葬)하였다가 장례(葬禮)를 지내기 위해 운구를 하려고 할 때 장정(壯丁) 호상군(護喪群)들이 도무지 상여를 들어 움직일 수 없었다고 전한다. 이에 경상감사(慶尙監司) 한준겸(韓浚謙)이 장산을 마련하여 군관(軍官)으로 하여금 호상(護喪)토록 하여 장군(將軍)의 예(禮)에 따라 장례(葬禮)하게 하였다. (선조실록)
23. 복권과 증직 가자가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다.
선조(宣祖)는 배설(裵楔) 사후(死後) 6년(六年)에 선무원종공신1등(宣武原從功臣一等)에, 부친(父親) 배덕문(裵德文)에게 선무원종공신 3등(宣武原從功臣三等)에 책록(冊錄)하고, 1610년(광해2년)에 가선대부(嘉善大夫) 호조판서(戶曹判書)를 추증(追贈)하고 무려 274년이 지난 다음 고종(高宗)은 ‘배설(裵楔)장군의 충절이 뛰어남’을 들어 자헌대부(資憲大夫) 병조판서(兵曹判書)에 가자함으로서 일본의 재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대신들과 백성들에게 임진왜란의 교훈을 상기시키고자 하였다.
(선조실록, 선무원종공신 록권, 증직 교지, 승정원일기. 경산지. 성산지. 등암선생문집)